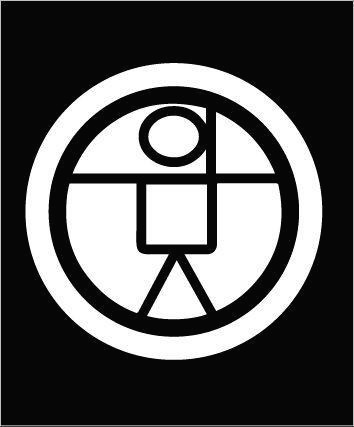티스토리 뷰
In the Field: Participating, Observing, and Jotting Notes / 25.02.23. / 화니짱
인무연 2025. 2. 23. 23:25p22 :
1) 즉각 기록 / 2) 집에와서 다시 정리
이러한 현장 개입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일상의 리듬과 평범한 관심사 속에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킨다(increases openness to others’ ways of life). 두 번째 방식은 보다 세부적이고 현재에 가까운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a more detailed, closer-to-the-moment record of that life). 실제로 대부분의 현장 연구자들은 특정 시점마다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 때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글을 쓰지 않고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사건에 집중하여 이를 기록하기도 한다.
"인류학자란, 결국 하루의 끝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Jackson, 1990b:15)
p23 :
2) "현장 연구자들은 글쓰기가 이러한 관계 속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field researchers seek to keep writing from intruding into and affecting these relationships)."
이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타인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순간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글쓰기 및 보다 광범위한 연구에 대한 책무(research commitments)는, 연구자가 함께 생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공유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betrayal)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반면, 연구를 위해 글을 쓰는 민족지학자(ethnographers who participate in order to write) 들은 자신의 연구 관심사를 보다 공개적으로 연구 관계 속에서 드러내며(pursue and proclaim research interests more openly), 연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연구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킨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글쓰기 문제를 다루는 "참여를 통한 글쓰기(Participating-in-order-to-write) 접근법" 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접근법은 글쓰기, 참여, 관찰 간의 상호 연결성(interconnections between writing, participating, and observing) 을 강조하며,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방법은 "글을 쓰기 위해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감각(sense of what and how to write)은 관찰 방식에 의해 형성되고 제약을 받는다" 는 점도 인정한다.
p24:
이러한 기록은 초기 인상(initial impressions)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관찰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환경의 독특한 특성을 감지하는 능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for observers tend to lose sensitivity for unique qualities of a setting as these become commonplace).
- 구 초반에는 연구자가 스스로의 경험과 직관을 활용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noteworthy incidents)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현장 연구자는 자신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 또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나타난 감정적 분위기(feeling tone), 인상(impressions), 그리고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도 기록해야 한다.
p25 :
개인적인 반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관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 먼저, 연구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자신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연구 대상의 반응과 다른 감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기록할 때, 초보 민족지학자(beginning ethnographers) 들은 종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tend to judge the actions of people in the setting, for better or worse, by their own, rather than the others’, standards and values).
✅ 연구자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denial), 연구 노트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omitting them).
- 자신의 강한 반응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것.
✅ 바람직한 접근법:
- 연구자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register her feelings),
- 그런 다음, 한 걸음 물러서(step back and use this experience to ask)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연구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연구 대상자들도 나와 같이 놀라고(shocked), 화나고(angered), 혹은 기뻐하는가(pleased)?
-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가(under what conditions do these reactions occur)?
-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how did those affected cope with the incidents and persons involved)?
p27 :
✅ 연구자는 어떻게 지역적 의미(local meanings)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직접 질문을 통해(local people에게 직접 "이게 왜 중요해?"라고 묻는 방식)
- 간접적이고 추론적인 방법을 통해(indirectly and inferentially)
- 연구자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naturally occurring interaction)에 주목해야 한다.
- 이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시각(perspectives)과 우려(concerns)를 읽어낼 수 있다.
p28 :
민족지학자인 Katz는 "사람이 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가?" 라는 질문과
"어떻게 기름을 넣는가?" 라는 질문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다.
📌 "왜?"를 묻는 방식:
- "기름이 부족해서 넣었다."
-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갔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설명(top-of-the-head explanations) 은 실제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 예를 들어, 나는 기름이 필요하기 전부터 이미 기름이 부족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 연료 게이지가 낮아졌다고 해서 바로 주유소에 가지 않았다.
- 보통 나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미리 주유소에 도착한다.
📌 "어떻게?"를 묻는 방식:
- 기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주유를 할 것인지" 를 설명할 수 없다.
- 나는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 자동 정지 기능을 사용하여 주유를 멈출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러 마지막까지 채울지(top up with a final squeeze) 를 선택할 수도 있다.
✅ 핵심 개념:
- 사람의 행동을 "왜?"(why)라는 단순한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how)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 행동을 자세히 기술할수록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p29 :
✅ 현장 연구자는 관찰하는 순간, 특정 사건이나 인상을 바로 기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때 "Jottings" 을 사용한다.
- "Jottings" 은 간략한 키워드나 문구로 작성된 짧은 기록 이다.
- 이것은 후에 기억을 되살리고(jog the memory), 더 상세한 서술을 구성(evocative descriptions)하는 데 도움을 준다.
✅ Jottings의 특징:
- 단순한 "headnotes"(머릿속에 저장하는 메모) 를 넘어 실제 기록으로 남긴다.
- 대화(dialogue)나 행동(actions)을 빠르게 기록한 스크리블(scribbles, 휘갈겨 쓴 메모) 형태일 수도 있다.
- 후에 이를 바탕으로 보다 풍부한 서술을 만들 수 있다.
p32 :
관찰한 장면과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적(sensory) 세부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각적인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그날의 분위기와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디테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 기억을 되살리는(jog the memory) 역할을 하는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 연구자는 배워야 한다.
- 이러한 특징과 특성을 기록함으로써 연구자는 기억을 보완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기억 회상 스타일(recall propensities)을 반영하는 고유한 메모 방식(jotting style)을 개발하게 된다.
- 예를 들어,
- 어떤 연구자는 장면 전체의 분위기를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반면, 어떤 연구자는 거의 전적으로 대화(dialogue)만 기록한다.
- 또 다른 연구자는 비언어적 표현(예: 목소리, 몸짓,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한다.
- 일부 연구자는 색채와 형태 같은 시각적 디테일을 기록한다.
- 연구자들은 시험과 오류(trial and error)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필기 방식을 익히게 된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장면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묘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초보 연구자들은 대개 인상주의적(impressionistic)이고, 의견이 담긴(opinionated)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런 단어들은 평이한 평가적 요약을 작성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상세하고 질감 있는 묘사를 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 예를 들어,
- 연구자가 어떤 사람의 업무 태도를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이런 메모는 나중에 연구자가 필드노트를 작성할 때 모호한 기억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 또한, 현장 사람들이 특정한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평가했는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비슷한 예로,
- "보호관찰관(probate officer)이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 대해 강의한다."
- "학생 A는 항상 순응적(compliant)—즉, 보호관찰관에게 늘 동의한다."
이런 식의 진술은 너무 일반적이며, 보호관찰관과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p37 :
우리는 일반적인 정책으로서 필드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 목적을 알릴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연구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 의도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공개적인 접근 방식은 연구자의 활동이 드러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배신감(betrayal)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만든다.
하지만, 연구 계획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연구자가 지속적인 부정직함(ongoing inauthenticity)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자의 심리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물론, 연구의 목적을 사전에 알린다고 해서 연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strained relations)과 윤리적 딜레마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더라도, 그들이 연구가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는지 또는 연구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지(do to carry it out) 모를 수도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하루가 끝난 후 필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의 존재에 익숙해져서 그가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주변부에 있는(marginal) 또는 일시적인(transient)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신원과 연구 목적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를 공개적으로(overt)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는 필드 노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연구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메모를 공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민감하게 행동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방해하거나(goings-on in the field) 방해 요소가 되는 것(detracting)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연구자는 연구 초기부터 대상자와의 접촉을 통해 필드 노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연구자가 ‘기록자(note-taker)’의 역할을 확립하면, 연구자의 메모 작성은 자연스럽게 연구 활동의 일부로 인식된다.
필요할 경우, 연구자는 처음에 필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언어학자는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요구되는 것을 이해하고, 연구자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협력(tolerate and accommodate)할 수도 있다.
p39 :
따라서 즉석에서 메모를 하는 것은 현재의 상호작용 맥락에 신중하게 맞추어져야(calibrated) 한다.
즉석 메모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거나(strain),
연구자가 설정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대화(activities occurring in the setting)에 대한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계속 노트에 집중하다 보면,
미묘한 표정(fleeting expressions), 미세한 움직임, 심지어 중요한 대화 내용까지 놓칠 가능성이 있다.
즉석에서 메모를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경우,
연구자가 필기를 위해 중간에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몰입(involving)하여, 필기할 시간을 낼 수 없게(preclude)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기억(memory)에 의존해야 하며,
나중에 사건을 더 완전하게 회상(fuller recollection)할 수 있도록 핵심 문구(key phrases)를 집중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드물고, 극히 드문 경우(rare occasions)에만 필기를 한다면,
연구자가 마을 전체가 밤새 춤을 추는 행사에서 필기를 한다면
이는 마치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규범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perceived).
즉, 긴밀한 공동체(close-knit village) 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통 즉석에서 메모를 하는 연구자들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 몰래 조용히(out of sight) 메모를 한다.
사건이나 대화가 끝난 직후, 연구자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메모를 남길 수도 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행동 방식을 채택(adopt)하여,
프라이버시를 위한 순간을 만들어(carve out a moment of privacy) 메모를 하는 방법도 있다.
연구자들은 화장실, 빈 점심 식당(deserted lunchroom), 계단(stairwell), 물품 보관실(supply closet)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메모를 남긴다.
p41어떤 사람들은 필기를 하는 연구자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글쓰기를 거의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두 문화(oral cultures)에서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낯선 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글쓰기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있어서, 필기가 침해적(intrusive)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한 번은, 잠비아(Zambia)의 한 마을 원로가
한 민족지학자가 자신의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 종이 조각(scrap of paper)에 적어놓자,
더 이상 말을 계속하기를 꺼려했던 적이 있었다.
후에 그 연구자는 식민지 시대(colonial times)에는 정부 관리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세금 목적 및 노동력 모집을 위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중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비밀, 창피함, 혹은 너무 노출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는 내용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지 않을(might not object) 수도 있으며,
오히려 연구자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연구자가 특정 정보가 창피하거나, 공개될 경우 참여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로는 그 내용을 필기해 두었다가 나중에 최종 기록물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민족지학자가 현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현장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순간(defining moment)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필기 방식을 취하며,
이러한 방식들은 연구자의 전략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연구 환경 및 연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필기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노골적인(open) 필기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기하여
어색한 상황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언제, 어디서 필기할지 결정할 때, 한 가지 "최선의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현장 연구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경험 법칙(a good rule of thumb)"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접근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지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세계(life-world)와 일상적 경험에 깊이 몰입(immersion)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필연적으로(inevitably) 외부인으로 남게 된다.
단순한 몰입은 결코 "동화(merging)"가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연구자는, 보통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연구자는 외부 연구자로서의 위치를 유지(retains commitment)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외부적 연구(exogenous project)"의 입장에서,
타인의 삶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연구자가 "내부적 연구(indigenous project)" 를 수행한다면,
이는 단순히 특정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해진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부 일상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세계 속에서 이방인으로 남는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기록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리된 경험을 창출한다.
연구자가 기록을 하는 동안,
즉석에서 짧은 필기(jottings)를 하거나, 보다 확장된 필드 노트(fieldnotes)를 작성하는 순간,
연구자는 즉각성(immediacy)을 창출하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한다.
즉, 연구자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친밀성(proximity) 속에서 존재하는 동안에도,
자신과 연구 대상 사이에 경계를 만든다.
결국, 대부분의 사회적 환경에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행위는
연구자가 완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로 존재하게 만드는 이상한 경험을 유발한다.
연구자는 필드워크를 수행하면서,
"무엇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관찰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즉, 그는 종종 사건과 경험에서 벗어나(steps outside of scenes),
이를 기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자유게시판 > 유학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주차] Problems of Editing "First-Person" Sociology - Robert "Bob" Blauner /25.02.23 / 오은 (0) | 2025.02.23 |
|---|---|
| 입학서류 관련 공증절차 (0) | 2024.12.09 |
| 웰컴센터 쪽과 주고받는 메일과 서류들. (0) | 2024.12.04 |
| 박사 대학행정 관련 제출 서류들 (내가 작성한 서류들) (0) | 2024.12.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신학정치론
- 개인심리
- 루이알튀세르
- 딘애치슨
- 로마사논고
- 공화국
- 집단심리
- 한국전쟁의기원
- 의식과사회
- 이데올로기
- 검은 소
- 계급투쟁
- 야생의사고
- 생산양식
- 생산관계
- 레비스트로스
- 마키아벨리
- 이탈리아공산당
- virtù
- 루이 알튀세르
- 옥중수고이전
- 무엇을할것인가
- 옥중수고
- 브루스커밍스
- 알튀세르
- 그람시
- 스피노자
- 헤게모니
- 안토니오그람시
- 프롤레타리아 독재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