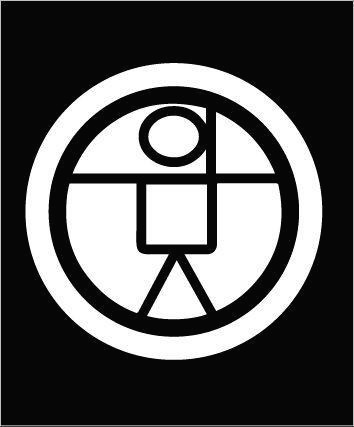티스토리 뷰
3장 절망의 모든 형태
b.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 볼 수 있는 절망
자아는 실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아에는 무한성과 유한성이 귀속된 것처럼 가능성과 필연성이 귀속되어 있다. 아무런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자아는 절망해 있다. 아무런 필연성도 가지지 못한 자아도 역시 절망해있다.(81)
α. 가능성의 절망은 필연성의 결핍에 존재한다.
무한성이 유한성에 의해 제한되는 것처럼 가능성은 필연성에 의해 견제된다. (자아가) 그 자신일때에는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것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필연성을 포기하고 아무런 필연적인 것을 가지지 않을 경우 이것이 가능성의 절망이다. 자아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된다. - 자아는 가능성 속에서 발버둥 쳐 피곤해질 뿐 그 장소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또 어딘가 다른 장소에 다다를 수도 없다.
필연성을 가지지 않은 자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점점 순간적인 일들이 되고 가능성은 더욱더 강렬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환영이 굉장한 속도로 뒤를 이어 나타나므로 결국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처럼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개체가 자기 자신의 구석구석까지 신기루(단순한 가능성)가 된 마지막 순간이다.
그래서 자아에 결핍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현실성이다.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필연성이 가능성과 현실성의 통일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성이 가능성과 필연성의 통일인 것이다. -> (철학자들은 보통 필연성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통합하는 요소라고 설명하지만, 키르케고르는 필연성이 아니라 현실성이야말로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합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즉 현실성이 없다면, 가능성과 필연성도 공허한 것이 된다.)
자아가 이처럼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힘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확실히 힘이 부족한 탓도 있기는 하나 적어도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의미로 결핍된 것은 자신의 자아 안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것(자기 자신의 한계라고 부를수도 있는 것)에 머리를 숙이는 복종의 힘이다. 그는 스스로의 자아를 공상적으로 가능성의 거울에 비춰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상실한 것이다.
자아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이렇게도 보이고 또 저렇게도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반쪽의 진리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무언가의 유희에 참여하도록 꾀어내는 경우와 흡사하다. 어리이는 언제든 유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다. 이 부모가 필연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 동화나 전설 속에 새를 쫓아가는 기사-결국 숲속을 헤매게 된다. (동경적인 가능성)
예) 우수-인간은 사랑의 우수에 사로잡혀 불안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세미나 발제문 >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키에르케고르, 1편 3장 B의 (a) / 25.04.16 세미나용 정리 / 화니짱 (0) | 2025.04.15 |
|---|---|
| 죽음에 이르는 병 - 키에르 케고르 / 1편 3장 A.b.의 β. /25.04.09/ 노그래 (0) | 2025.04.09 |
| 죽음에 이르는 병 - 키에르 케고르 / 3장 1편 A. a / 노그래 (0) | 2025.03.26 |
| 죽음에 이르는 병 -키르케고르/1편 II장 절망의 보편/25.03.19/용용이 (0) | 2025.03.19 |
| Natural Law - G. W. F. Hegel / p92-94 / 25.02.27 / 화니짱 (0) | 2025.02.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옥중수고
- 이탈리아공산당
- 옥중수고이전
- virtù
- 로마사논고
- 집단심리
- 이데올로기
- 알튀세르
- 루이 알튀세르
- 검은 소
- 스피노자
- 야생의사고
- 계급투쟁
- 개인심리
- 한국전쟁의기원
- 생산관계
- 그람시
- 브루스커밍스
- 안토니오그람시
- 루이알튀세르
- 무엇을할것인가
- 프롤레타리아 독재
- 딘애치슨
- 생산양식
- 레비스트로스
- 신학정치론
- 마키아벨리
- 의식과사회
- 헤게모니
- 공화국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