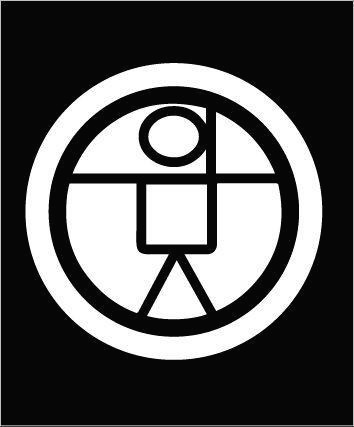티스토리 뷰
[7주차] Can There Be a Feminist Ethnography? Judith Stacey/ 25.02.16. /오은
인무연 2025. 2. 16. 19:36Can There Be a Feminist Ethnography? Judith Stacey
여성 민족지학이 가능할까 ? 주디스 스테이시
저자 소개
주디스 스테이시 Judith Stacey 는 1943년 생으로 젠더, 가족, 성적지향성, 페미니스트, 퀴어 중심 사회학 및 문화 분석 연구자로 뉴욕대 석좌교수이다. Unhitched 라는 저서를 통해 남아프리카의 폴리가미 가족, 중국 서남부 소수 민족인 모계사회 전통의 모수오 Mosuo 족, LA 지역 게이 부모의 경험 등을 다루며 서구적 모델로서의 결혼에서 벗어나는 여러 형태를 연구했다. "(How) Does the Sexual Orientation of Parents Matter? 부모의 성적 지향성이 중요한가 ? " 라는 글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모에게 양육되는 어린이들이 보다 전통적인 헤테로섹슈얼 부모 가정에서 자랄 경우보다 더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강하며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하게 될 확률이 많다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개인적 접근
여성학, 혹은 페미니즘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것은 90년대 후반의 일이다. (조한혜정, 김현미 등)
한국 : 2025년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용어가 변용되어온 데에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가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에서 나타났던 래디컬 페미니즘은 적어도 대중이 사용하는 온라인 상에서는 터프, 남성 혐오, 트랜스혐오, (제주도 예멘) 난민 혐오, 이슬람 혐오 등으로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계는 그런 양상과는 또 매우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 : (내 위치에서) 미술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도나 해러웨이같은 인류학-여성학 학자나, (생태학, 과학기술학, 여성학) – 어슐러 르귄, 옥타비아 버틀러(아프로 퓨처리즘과 페미니즘) 등의 SF 작가들과, 주디스 버틀러의 저술 등은 필수 교양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 비록 한국보다 용어 사용 자체는 가시적으로 용인된다고 하나, 실제 양상은 ?
용어
Feminism 여성학 , Feminist 페미니스트 로 통일
초록 요약
인식자 Knower와 인식체 Known 간의 평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여성학 연구는 민족지학적 방법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평등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오히려 실증주의적 연구보다 연구자가 대상을 착취, 배신, 포기하게 되는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아이러니가 실제 연구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학과 민족지학 간의 더 큰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경
1988년에 쓰여짐 (최초의 여성학 학위가 미국 코넬 대학에 개설된 것은 1969년이다.)
서구 여성학과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문제를 중국의 가부장제와 혁명에 비추어보는 연구
연구 주제의 특성상 주로 서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macro , 추상적인 연구 - 실제 여성이나 가부장제 x
첫번째 연구 후 저자는 1984년부터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가족 및 성별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는 실제 대면 연구 경험을 원했으며, 이 방법론이 페미니스트 원칙에도 들어맞는다고 생각
역사적 맥락
당시 여성학자들은 주류와 대비되는 여성학 학문의 목표와 방법론을 구분
(주류) 실증주의적 이원론, 추상화, 분리 VS 통합적이고 다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식
연구자와 그의 대상, 인식자 Knower와 인식체 Known 간의 진정성, 상호성, 상호주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평등주의적 연구 과정을 추구
Renate Duelli Klein : "여성들이 여성을 연구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법론”을 추구하며, "이 방법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착취하는 것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확신했던 이유 : (innocence)
- 민족지학과 여성학이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통점
저자와 Barrie Thorne : “사회학에서 사라진 페미니스트 혁명”, 1985
경험 강조 ethnography emphasized the experiential.
지식을 컨텍스트적이고 관계적으로 파악approach to knowledge was contextual and interpersonal
그러므로 일상 현실과 인간 행위 human agency 에 보다 깊이 연결
민족지학에 있어서 연구자는 스스로가 연구 “도구instrument ” 이므로, 공감, 연결, 관심 등 여성적 특질 필요
연구 대상에게 더 많은 존중과 권력 부여
- Ann Oakley, 전통적 인터뷰 방식의 비판 : 위계적, 대상화시킴objectifying , 가짜로 “객관적인” 중립성, 비인격적 – 여성학적 연구는 공감과 상호 관계mutuality에 기초되어야 한다
- Shulamit Reinharz, 경험적 참여 연구 방법론의 단점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과 발전시키는 관계의 질과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이해의 질에 비해 미미해 보인다"
2년 반이 지난 후 : 비판 (loss of ethnographic innocence)
2년 반의 현장조사 경험 후 저자의 변화 : 페미니스트 윤리와 방법론 사이의 모순을 인식
모순 1/ 민족지학 연구 과정
a. 방법론 자체
인간 관계, 참여, 애착에 기반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은 인류학자에 의해 조작 manipulation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
- 에피소드
주요 정보 제공자 key informant 였던 기혼의 기독교 근본주의 여성이 개종하던 시기에, 레즈비언 연애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연구 시작 후 6개월 때 알게 됨(헤어진 전 연인이 말해주었음). 윤리적으로 무척 어색하고, 상황적으로 불안정한, 삼각관계, 배신, 진짜와 거짓말이 뒤섞이는 상황. 몇 달 후 정보제공자가 저자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 게다가, 정보제공자와 그의 전 연인은 저자의 충성심, 동정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공통된 역사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위해 경쟁.
→ 연구자와 "원주민 native"는 겉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로, 그에 인한 불평등과 잠재적인 배신감이 내재
b. 과정 자체가 착취적
“참여 연구 정보제공자가 연구자에게 공유하는 삶, 사랑, 비극은 결국 민족지학적 제분소에서 빻아지는 데이터-재료이다. The lives, loves, and tragedies that fieldwork informants share with a researcher are ultimately data-grist for the ethnographic mill, a mill that has a truly grinding power.“
- 에피소드
주요 정보제공자의 사망. 친구이자 연구자라는 두 개의 다른 역할로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음. 구술사 오디오 테이프를 누구에게 선물할지, 상처입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지 ? 연구자로서 장례라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장례식과 가족이 겪는 슬픔 과정도 추가적인 연구 "기회"로 작용하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더 많은 가족의 "진실"을 연구자의 민족지학적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준 기회로 작용. 이에 대한 불편한 인식에 직면.
→ 민족지학자가 관계자(참여자)이자 착취하는 연구자(관찰자)이므로, 역할 사이의 이해와 감정의 충돌이 불가피
모순 2/ 연구의 결과물
민족지학 연구 과정과 출판되는 텍스트 결과물의 불일치
연구 과정 자체는 상호협력적이 되더라도 연구 결과물은 연구자의 것 : 연구자의 목적, 해석, 목소리
그러므로 민족지학에 있어서 불평등, 착취, 배신의 요소들은 내재적임
반론 : 여성학자들은 정보제공자와 논의하고 협상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반례 : 위에 언급한 레즈비언 관계에 대해 몇년간 논의했지만, “연구 협력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함.
→ 원칙 (연구 대상자와 협력적이고 평등적인 연구 관계에 대한 존중)을 준수하면 레즈비언 경험을 향한 동성애 혐오적 침묵과 결탁하게 됨 → 민족지학적 "진실"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의식적으로 왜곡 → 어떤 결정이건 저자의 민족지학은 페미니스트 원칙을 배신하게 됨
모순 → 역설 ?
평등을 추구하는 민족지학적 방법이 실증적, 추상적, "남성적"인 연구 방법보다 피험자를 훨씬 더 큰 위험과 착취에 노출하고, 상호성이 클수록 위험도 커짐 ?
딜레마의 해결 가능성
- 여성학과 인류학-사회학 사이 : 상호교류 거의 없음
- 여성학과 포스트모던 민족지학 사이 : 높은 관련성
포스트모던 민족지학
비판적, 자기 성찰적, 기존 민족지학 글쓰기가 내재하는 위계적이고 권력적인 관계 비판 글쓰기 개척
가식적 중립성, 묘사 탈피
글쓰기란 (단순 관찰이 아닌) 문화적 구성, 자신과 타자의 구성
James Clifford "민족지학의 역사적 곤경"은 "문화의 재현이 아니라 항상 발명의 문제 the fact that it is always caught up in the invention, not the representation of cultures."
비판적 민족지학
Vincent Crapanzano "해석 interpretation 은 남근적, 남근-공격적, 잔인하고 폭력적인, 파괴적인 행위로 이해되어왔으며, 기름지고, 다산하며, 결실이 많고, 창의적인 것으로도 이해되어 왔다"
- 민족지학자를 칭할 때 늘 남성대명사를 사용 “그의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 person 이 아니라 입장 stance으로서 쓰는 것이기 때문”
→ 페미니스트적 통찰을 그들의 반성적 비판에 통합
인류학자의 곤경에 대한 포스트모던 민족지학적 해결책
민족지학적 과정과 산물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
비판적 민족지학자들과 여성학자들
- 중립적인 관찰, 분리된 입장 배재
- 피험자를 협력자로 인정 (연구자가 연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
- 문화 연구 자체가 가진 필연적으로 침해적이고 불평등한 특성 인정
민족지학자들은 이미 연구 텍스트 결과물이 갖는 왜곡과 한계를 인지
- 해석적 작가로서의 개인-저자를 인정
- 다양한 형식으로 연구 대상의 목소리와 관점을 서사에 더 많이 배치하는 대화적 형식을 차용, 연구 과정과 결과의 불일치와 특수성을 보다 진정성 있게 반영
- 해체주의적 형식 : James Clifford가 주창한 바와 같은 “파편적 진리들 Partial Truths“ 목표
민족지적 진실들은 부분적, 불완전하나, 오히려 그 파편성이 엄격하게 지켜질 때 구상적 기지 representational tact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포스트모던” 민족지학 문헌과 여성학적 방법론 성찰
공통점 : 서로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한계에 대한 겸허함 humility
Marilyn Strathern 여성학과 민족지학 사이의 “어색한 관계” 는 둘 다 “윤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신과 “타자” 사이의 관계에서 양립 불가능한 구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여성학은 남성 “타자”와의 적대적 관계를 가정한다고 주장하며, 권력 불평등에 대한 예리한 민감성을 기반으로, 타자와의 동맹과 협력이라는 인류학적 가식 pretentions 을 넘어서 여럿의 저자 authorship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지학적 전략을 추구)
Marilyn Strathern에 대한 저자의 견해
여성학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은 남성이 주도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에 비판적으로 적용 가능
단, 연구가 여성 대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분리의 망상delusion of separateness 보다 동맹의 망상delusion of alliance 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더 고통
여성학과 비판적 민족지학은 그들이 공유하는 불평등과 타자에 대한 관계, 연구, 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민감성 sensitivities과 순진함 naivetés을 공유
결론 : 여성학 민족지학자의 딜레마와 해결 방안
포스트모던 전략은 저자가 연구 중 겪었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함
완전한 여성학 민족지학은 존재할 수 없으나, 부분적으로 여성학적인 민족지학은 존재 가능
-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적용한 문화의 기술 - 미덕은 존재하고 유효함
자기 비판 : 민족지학적 악이 아닌, 스스로 가졌던 민족지학적 미덕에 대한 환상에 대한 비판 가능성
단점에도 불구하고 참여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관계 형성 가능
예시 : 앞서 언급한 사망한 정보 제공자의 딸은 저자에게 그의 연구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가능했다고 감사 표시 → 연구 대상과 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관심과 애정 가능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학과 비판적 민족지학의 융합은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맥락성, 깊이, 뉘앙스를 구축 가능
크로스리딩
Lila Abu-Lughod, « Can There Be a Feminist Ethnography? », 1990
- (서로의 글을 모른 채) 동일한 제목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판. “여성”이라는 말이 함유하는 동일성 혹은 균일성이 섣부른 것은 아닌지 ? – (이상은 Feminist Ethnographies 에서 가져온 요약 :
- Sharing an identity as queer may be overshadowed by economic conditions; being migrants evidently does not erase racialised or educational differences; both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as entrepreneurs, cat lovers or feminists, assume identificatory positions. We have turned and twisted on positions that invite conversations, but which therefore must also be considered in ways other than positions that establish dis/identification.
Kamala Visweswaran. Fictions of Feminist Ethnography, 1994
- 배신 betrayal 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 글. Chapter 3 : Betrayal : An analysis in three acts
읽어야 할 글 Further reading
Linda Berg, Feminist Ethnographies, 2023 (단행본)
+ James Clifford, On Ethnographic Allegory, 1997 (“문화를 쓴다” 라는 책에 한역)
+ Thinking for 태정 : James Clifford, Returns: Becoming Indigenous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
+ Margery Wolf, A Thrice-Told Tale Feminism, Postmodernism, and Ethnographic Responsibility
3장으로, 탄 씨라는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이웃들은 그가 신병이 났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남편이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를 조종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장은 단편 소설 형식, 두번째 장은 참여 연구 노트, 세번째 장은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다. 각 장에는 주석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성찰성, 다성성 polyvocality, 픽션 대 민족지학, 실험적 민족지학에 대한 소고 등이다. 이 텍스트는 민족지학자가 (신)식민지적 연구 방법을 페미니스트적으로 비판하며, 참여자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만 동시에 연구 과정 중 (상상적인) 책임을 그에게 넘기지 않는 것의 민족지학자로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장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p12, Linda Berg, Feminist Ethnographies, 2023)
앞으로의 방향성, 과제
윤리적 측면에서 역시 다른 연구들보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에 대한 위계에 따른 윤리적 고민이 강하게 느껴졌고, 지난주 미흡했던 느낌 (엘리아차르가 한 문단으로 언급했던 여성연구자로서의 위치)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윤리적 원칙과 그 원칙을 배반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판단이 가능할까 ?
저자의 태도는 그가 동일시할 수 있었던 현장 (미국인, 여성, 공유 언어, 문화, 지역)이었기에 더 크게 나타났을까 ? Visweswaran은 타밀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차츰 배워가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여성학의 의제인지, 민족지학의 의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연구자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
글을 읽으며 풍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싶은 것이 많이 생겼다. 단, 이것은 흥미에 가깝고 현재 내 필요성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논문과 그에서 파생된 읽기 자료 중 포스트모던 형식 인류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 여성학에 대해
90년대 후반에는, 개인적으로 여성학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당시에는 여성학과 여성적, 남성적, 등의 전형에 대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성향이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적 규제에 따라 나타났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2010년 이후로, 그리고 특히 출산의 경험 이후로 느끼는 - 실제로 사회에서 존재하는 나라는 개인은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틀, 세계와 내 안에 내재된 가부장적 질서, 인종적 경험, 개인의 성적 지향성, 몸 그 자체와 그것이 인지되고 재현되는 방식 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부분에서 정희진이 말했던 것처럼, 여성학은 인식론적 틀로 필요불가결하다.
'프로그램 아카이브 > 영어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otal
- Today
- Yesterday
- 알튀세르
- 무엇을할것인가
- 옥중수고이전
- 생산관계
- 브루스커밍스
- 마키아벨리
- 그람시
- 야생의사고
- 안토니오그람시
- 옥중수고
- 로마사논고
- 계급투쟁
- 검은 소
- 헤게모니
- 의식과사회
- 이탈리아공산당
- 집단심리
- 스피노자
- 루이 알튀세르
- 이데올로기
- 공화국
- virtù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개인심리
- 레비스트로스
- 딘애치슨
- 생산양식
- 루이알튀세르
- 한국전쟁의기원
- 신학정치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