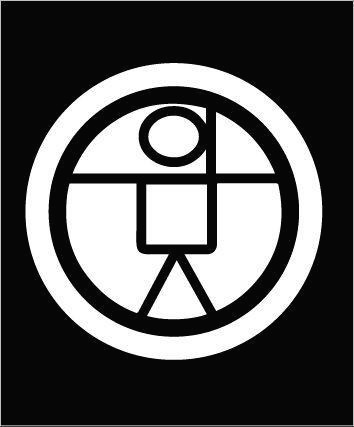티스토리 뷰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2부 발제 -초코
고통을 다루는 언어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지 못하면 주변을 배회하던 언어들이 대신 득세해 그 자리를 꿰찬다. 사려 깊지 못한 언어들이 고통을 희생양 삼는 것이다. 엄기호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자판기에서 꺼낸 것 같은 납작한 말들’은 고통마저 납작하게 만든다. 이번 논의는 어떻게 고통이 납작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논의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감(또는 자존감)으로 넘어간다. 우리의 자존감은 보통 자족과 인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회적 영역이나 친밀성의 영역 없이 내적인 영역의 자존감을 채우는 건 쉽지 않다.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한다. 만약 우리의 자존감이 성과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사회의 성과체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삼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 그들이 노력으로써 이 체제에서 더는 인정받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쳐서다.
성과(사회적 영역)에서 인정받기를 실패하면 관심(친밀성 영역)을 유발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엄기호 작가는 말한다. 사실 친밀성의 영역은 인간의 성과나 속성에 기반하지 않는 사랑과 우정인데, 이 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남녀 관계를 예로 들면, 상대방을 반대편 ‘성(性)’으로만 대한다든지, 관계에서 더 큰 유익을 바란다. 존재 자체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재밌는 행위를 ‘소비’하는 경향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한 몫 한다. 웃음을 자아내는 소재 중에서 남을 놀리거나 비하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이 비하는 소수자에 대한 비하로 옮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소수자의) 고통은 그들의 웃음 소비 아래서 ‘납작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을 재밌게 함으로써 주목을 끌면서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이다. 일명 ‘셀럽’들의 추락은 타인의 비참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언론이라고 작가는 보고 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스캔들’이며,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춰내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짐짓 도덕적인 척하는 것이 최근 언론의 행태라고 보는 것이다.
친밀성의 공간을 제외한 곳에서 근대적 개인은 익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이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근대적 개인은 익명으로서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존엄을 보호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는 곧 그의 사회적 자유 전체를 박탈하는 것이자 존엄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타인을 발가벗기고 몰락을 구경하는 곳으로 변한 공론장은 ‘고통을 대결하는 콜로세움’으로 변해간다. 공론장은 자칫 한 마디 실수했다가 신성 털이기 되기 십상이고, 그래서 자기 검열을 통해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저 침묵하는 관객으로만 있으려고 한다. 작가는 망신과 몰락, 비참의 전시, 비참 간의 경쟁이라는 혐오의 악순환을 정의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콜로세움에서 물러나는 것밖엔 없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세미나 발제문 > 심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처음 만나는 심리학 OT 화니짱 (0) | 2019.04.03 |
|---|---|
| 고통은 나눌수 있는가 3부(19.01.23용 아카이브) (0) | 2019.01.23 |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1부(발제 : 노그래) (0) | 2019.01.09 |
| 고통은 나눌수 있는가 1부(19.01.09 모임용) (0) | 2019.01.09 |
| 2019.1.2모임발제문/호모쿵푸스 2부~끝/망고 (0) | 2019.01.02 |
- Total
- Today
- Yesterday
- 한국전쟁의기원
- 옥중수고이전
- 로마사논고
- 딘애치슨
- virtù
- 계급투쟁
- 집단심리
- 공화국
- 프롤레타리아 독재
- 마키아벨리
- 신학정치론
- 생산관계
- 의식과사회
- 루이 알튀세르
- 옥중수고
- 검은 소
- 이데올로기
- 이탈리아공산당
- 브루스커밍스
- 그람시
- 루이알튀세르
- 헤게모니
- 개인심리
- 알튀세르
- 야생의사고
- 스피노자
- 안토니오그람시
- 레비스트로스
- 무엇을할것인가
- 생산양식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